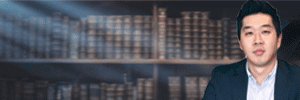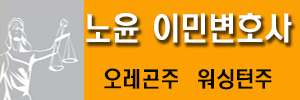나 어렸을적( 70년대 초반)한국 시골은 알루미늄색의 커다란 양은솥이 하나씩 있었다.
그 솥은 부엌하고 별도로 마당 한 귀퉁이에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어떤집은 드럼통같은
것을 잘라 그위에 솥을 걸쳐 놓으면 훌륭한 보조 아궁이가 되었다.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
실가리도 삶고 감자와 옥수수도 쪄 먹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겨울엔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여름철에 다시 마당 한가운데 등장한것 같다. 아마 여름엔 군불 땔 필요가 없고 그래서 따뜻한 아랫목이 필요없어서 일거다.
어느날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께서 양은솥에 적당히 물을 부은 다음 거친 멸치 한줌을 넣고 불을 지폈다.
물이 한참 끓은 후 미리 반죽해둔 밀가루 한덩이를 왼손에 들고 꾸부정한 자세로 서서 오른 손가락을 이용해 한점 반죽을 떼어 마치 손을 털듯이 물에 넣는다. 반죽이 손에 붙을세라 연신 왼손에 물을 적혀가면서…
끓는 물에 빠진 작고 불규칙한 덩어리는 금새 누런빛이 되어 물위로 끓어오른다. 그리고 간간이 국자를 이용해 솥안을 한번씩 저어준다. 또 허리를 펴고 잠시 쉬며 가끔씩 장작불을 발로 툭툭 차듯이 장작을집어 넣고는 다시 하던일을 계속하셨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장작 연기가 얼굴로 향할땐 오늘따라 바람이 문둥이같이 분다냐? 하시면서 잠시 땀인지 눈물인지를 팔소매로 닦은 후 자리를 바꿔서 계속하셨다.
그리고 풋고추와 애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후 한 여름 더운 날 퇫마루에 온가족이 모여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먹었던 수제비맛은 참으로 별미 이상이며 추억의 맛이었다.
오늘 산사모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산행을 짧게 마친 후 야외에서 별식으로 수제비를 끓여 먹는 날이다. 각자 분담하여 멸치국물육수와 밀가루 반죽 그리고 삽겹살 구워먹을 재료들을 집에서 미리 준비해왔다.
먼저 이동식 게스 버너에 불을 지펴 먼저 육수를 큰통에 부어 다시 끓였다. 물이 끓자 곧 반죽을 떼어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야채를 다지고 삽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나같이 얉게 해봐! 왜 나차럼 못해? 다들 부엌 경력이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서로 아웅다웅이다.
폼생폼사! 그리고 보기좋은 떡이 더 맛이 있다나?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썰어 구우며, 다른쪽에선 반죽을 떼어내 큰 통에 넣어 끓이면서 모두들 즐거워 하는 표정이다.
잠시후 광란의 쿠킹시간은 후다닥 지나가고 이제 먹기위해 한자리에 빙 둘러 앉았다. 잠시전 소란했던 것과는 달리 먹는 시간은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했다.
오늘 풍경은 나어릴적 모습과 많이 달랐다. 세월은 많이 흘러 양은솥 대신에 간편하고 유니크한 주방기기가 등장했고 또 편리하고 화력좋은 이동식 게스버너가 등장했다.
그리고 풍부한 식재료들이 큰 변화다. 내게 어릴적 시골 추억이 있듯이 아마 오늘의 풍경도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흐른다면 또 다른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궁금해진다. 앞으로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
어린시절 장작 연기에 눈물을 흘려가며 수제비 끓여 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각인되었듯이 오늘의 광경은 음식의 맛보다는 너는 그렇게했니? 이건 내스타일이야! 그리고 나도 한번 반죽 떼어보고 싶다고 아웅다웅했던 산우님들의 수제비 끓이는 광경이 아닐까?
글,사진 허관택 산사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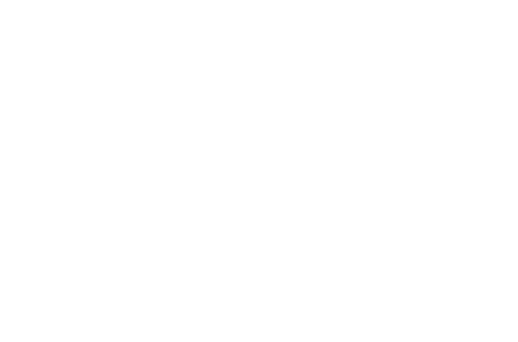
![[허관택의 산행일지] 수제비](https://www.koreanoregon.com/wp-content/uploads/2016/07/오레곤여행.jpg)



![[허관택의 산행일지] ‘조개 캐고 미역따고…’](https://www.koreanoregon.com/wp-content/uploads/2016/05/조개캐기.jpg)